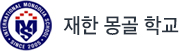몽골청소년 연극동아리 ‘솔롱고스’ 무대위 하소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1 13:31 조회7,0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몽골청소년 연극동아리 ‘솔롱고스’ 무대위 하소연
[경향신문 2006-11-24 18:17:47]
“쟤봐봐! 하루종일 공부만 해, 한국어도 못하는 게 짜증나!” “가까이 오지도 마, 재수없어 죽겠어!”
손가락질 하는 한국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한 몽골 아이가 흐느끼며 앉아 있다. 이어 아이들이 몽골 아이를 끌어당기며 해코지하다 결국 밀어 넘어뜨린다. 몽골 아이는 다쳤지만 아이들은 가방을 빼앗아 이리저리 던져가며 계속해서 놀린다.
서울 광장동 재한몽골학교의 연극동아리 ‘솔롱고스’가 이 학교 지하예배당에서 연습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23일 오후 서울 광장동 재한몽골학교 지하 예배당. 이틀 뒤 있을 ‘제3기 청소년문화벤처 페스티벌’ 공연을 앞두고 몽골학교 연극동아리 ‘솔롱고스’의 아이들 10명이 연극 연습에 한창이다.
이날만 벌써 4시간째 공연과 연습이 이어지는 강행군이다. 온몸을 던져 덤블링을 하고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오전·오후 수업까지 듣느라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연극을 통해 한국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없는 멸시와 조롱만이 가득한 한국은 몽골 아이들이 꿈꾸던 ‘솔롱고스’가 아니었다. ‘솔롱고스’는 몽골어로 ‘무지개의 나라’다. 아주 오래전부터 몽골에서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도 한국 아이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연극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째인 오랑거(14)는 한국 학교에 다니다가 3년 전부터 주한몽골학교로 전학했다. 오랑거에게 2년간의 한국 학교 생활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다. 어릴 적부터 한국에 살아 어느 정도 한국말에 익숙한 오랑거였지만 돌아오는 건 한국 아이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친구도 없이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짓궂은 아이들의 심술에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오랑거는 그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만을 안고 3년전 몽골인 학교가 세워지면서 한국인 학교를 미련없이 떠났다.
‘솔롱고스’의 아이들은 모두 오랑거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연극은 한국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상처만을 안고 몽골 학교를 찾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로 기억하고 싶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사이, 뭔가 자신들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극동아리 ‘솔롱고스’는 그렇게 작년 봄 탄생했다. 공연 제목도 ‘무지개’로 정했다.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한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은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연극에 녹아있다.
이후 ‘솔롱고스’는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등을 찾아 지금까지 수십차례 공연했다. 모두가 아이들처럼 ‘희망’을 필요로 하고 꿈꾸는 사람들이다. 최근엔 한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에 다녀왔고 며칠 뒤엔 주한 몽골대사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 활동 2년째인 지금도 아이들 중 절반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지만 상관없다. 아이들의 몸동작 하나하나에서, 눈빛 깊은 곳에서 그들이 꿈꾸는 ‘무지개’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오랑거는 “공연을 할수록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